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요즘 대세 배우 박정민은 출판으로도 자주 호명된다. ‘셀럽 출판’이 아니라, 형식과 태도를 고민하는 출판인으로서다. 그가 운영하는 출판사 무제가 '첫 여름, 완주'를 다시 꺼내 들었다.
‘듣는 소설’로 출발한 이야기는 크리스마스에 ‘읽는 소설’로 돌아왔다. 이미 완주한 이야기를, 굳이 한 번 더 달리게 했다.
출발점은 ‘듣는 소설’이었다. '첫 여름, 완주'는 올봄 대사와 지문이 뒤섞인 희곡형 텍스트에 배우들의 연기와 사운드 디자인을 결합한 형식으로 먼저 공개됐다. 일반적인 오디오북이 아니라, 등장인물마다 다른 배우가 캐스팅되고 소설 속 작은 소리까지 구현한, 과거의 라디오 드라마에 가까운 콘텐츠였다. 이야기보다 감각이 먼저 도착하는 소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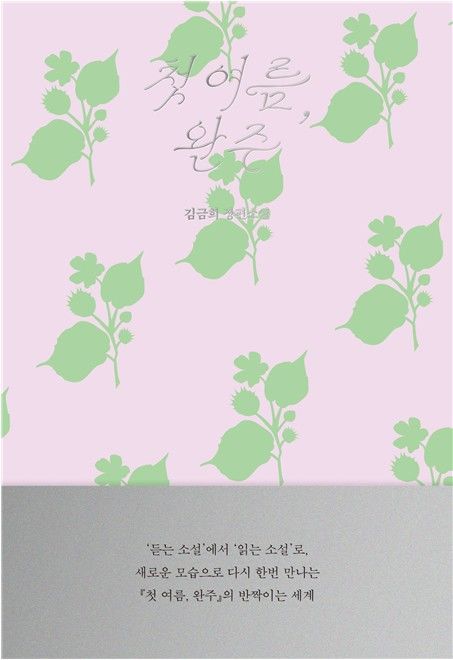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반대다. 소리를 걷어내고, 문장을 앞세운 ‘읽는 소설’로 다시 태어났다.
듣는 소설에서 지문으로 처리됐고 오디오북에서는 새소리로 흘러가던 장면은, 읽는 소설에서 “걱정이 멧새 소리와 함께 어우러졌다”라는 문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소리로 스쳤던 감각이 문장이 되면서, 이야기는 한 번 더 깊어진다.
같은 소설을 귀로 들었던 독자는 글맛을 새로 발견하고, 처음 만나는 독자는 이 이야기가 왜 ‘듣는 소설’이었는지 궁금해진다.
이 변화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결단이다. 이번 ‘읽는 소설’ 단행본은 애초 기획에 없던 결과물이다. 김금희 작가가 스스로 시간을 들여, 기존 희곡형 텍스트를 완전한 소설로 다시 썼다. 지문 속에 숨어 있던 소리와 공기는 문장이 되었고, 인물의 정서는 더 깊고 오래 머문다.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언어로 번역된 셈이다.
박정민은 '첫 여름, 완주'를 기획할 때부터 “언젠가는 꼭 아트북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했다. 완주라는 가상의 공간을 현실 어딘가에서 찾고, 그 감각을 사진과 이미지로 갈무리해 책으로 남기고 싶었다는 것이다.

'첫 여름, 완주' 아트북 *재판매 및 DB 금지
그렇게 완성된 이번 아트북 세트는 박정민이 직접 찍고 쓴 포토북과, 김금희 작가의 ‘읽는 소설’ 단행본으로 구성됐다. 포토북에는 완주를 닮은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며 촬영한 사진들, 녹음에 참여한 배우들에 대한 단상, 뮤직비디오 제작 스틸, 그리고 여러 작가들이 '첫 여름, 완주'를 읽고 각자의 해석으로 응답한 작업들이 함께 담겼다.
흥미로운 지점은 박정민 스스로 이번 세트의 백미로 자신의 포토북이 아니라 ‘읽는 소설’을 꼽는다는 점이다.
그는 “풋내기 출판인인 내가 대체 무슨 제안을 한 건지, 작가님은 왜 그 제안을 받아주신 건지 싶을 만큼 새롭고 훌륭한 소설이 재탄생했다”고 했다. 이 발언은 겸손의 제스처라기보다, 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확히 드러낸다. 중심에는 언제나 문장이 있다.
'첫 여름, 완주'는 멈추지 않았다. 듣는 소설, 종이책, OST 공개와 상영회, 그리고 전시와 아트북으로 이어졌다. 한 권의 책이 감각을 바꾸며 이동한 기록이다. 미술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는 작품을 전시한 것이 아니라 리서치와 제작 과정을 전시장에 올린 사례다. 창작의 결과보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은 동시대 미술의 아카이브 전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조용히 읽히고 덮이면 끝났던 매체였던 ‘책’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 들리고, 움직이며, 전시된다.
이 실험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이야기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그리고 출판은 어디까지 성실해질 수 있는가.
'첫 여름, 완주'는 한 편의 소설을 두 번 읽게 만든다. 한 번은 귀로, 한 번은 눈으로. 그 사이에서 독자는 깨닫는다.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배우 박정민도, 소설가 김금희도 아니다.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 그 자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