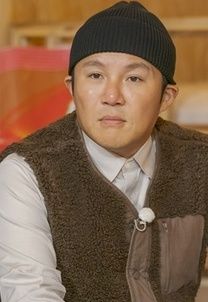올해 시간당 1만30원
재작성 의무는 없어
자동으로 인상 반영
근로자 요구 시 의무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취준생 A씨는 지난해 10월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근무기간은 6개월, 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되어 있었다. 작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은 셈이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뒤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오른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A씨는 1월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됐지만 1월 첫 주에도 카페 사장으로부터 연락이나 공지는 없었다. 그러자 A씨에겐 걱정과 의문이 생겼다. 통장에 인상된 시급을 반영한 숫자가 찍힐지, 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지난해 대비 170원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씩 일했다고 가정한다면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2024년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9860원 언저리의 시급을 받으며 일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오르며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주에게 그럴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요구할 때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근무지, 담당업무, 임금, 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이 바뀔 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재작성 의무는 없다.
최저임금의 경우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순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6조는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계약서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A씨 사례로 돌아가보면,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A씨도 예외가 아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A씨가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다면 어떨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업주에겐 재작성 및 교부 의무가 생긴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A씨가 속한 카페의 사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이 근로계약서 갱신 의무가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당국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노사관계의 핵심이자 필수적 재료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 상담 등에서도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계약서 재작성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다면 재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카페 사장이 A씨에게 변경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올해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지난해 대비 170원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씩 일했다고 가정한다면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2024년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9860원 언저리의 시급을 받으며 일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오르며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주에게 그럴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요구할 때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근무지, 담당업무, 임금, 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이 바뀔 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재작성 의무는 없다.
최저임금의 경우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순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6조는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계약서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A씨 사례로 돌아가보면,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A씨도 예외가 아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A씨가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다면 어떨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업주에겐 재작성 및 교부 의무가 생긴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A씨가 속한 카페의 사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이 근로계약서 갱신 의무가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당국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노사관계의 핵심이자 필수적 재료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 상담 등에서도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계약서 재작성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다면 재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카페 사장이 A씨에게 변경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