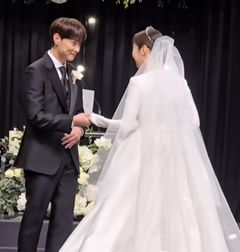24일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안전 사각지대의 외국인근로자들…안전교육·인프라 미흡해
80%가 아리셀 같은 제조업체 투입돼…산재율 높아 기피대상
안전인프라 부족한데… 정부 "올해 근로자 16만명 도입할 것"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6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마련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4.06.26.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6/NISI20240626_0020393859_web.jpg?rnd=20240626142233)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6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마련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4.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 땅에 죽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무고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26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숨진 근로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산업재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총 18명이 사망했다.
이 같이 화재 피해가 외국인에게 집중된 것은 미비한 안전교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대다수가 출입구나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반대편 공장 내부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사고 후 브리핑에서 "작업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대피에 어려움이 있던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소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참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피 경로를 숙지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의 이행 여부에 의혹이 제기된다.
목숨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사업장에서 단기간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기 어렵다.
아울러 이번 외국인 희생자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의 비자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등으로,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아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조업체인 아리셀도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노동법, 산업안전,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나, 일용직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26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숨진 근로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산업재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총 18명이 사망했다.
이 같이 화재 피해가 외국인에게 집중된 것은 미비한 안전교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대다수가 출입구나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반대편 공장 내부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사고 후 브리핑에서 "작업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대피에 어려움이 있던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소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참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피 경로를 숙지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의 이행 여부에 의혹이 제기된다.
목숨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사업장에서 단기간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기 어렵다.
아울러 이번 외국인 희생자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의 비자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등으로,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아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조업체인 아리셀도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노동법, 산업안전,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나, 일용직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 사흘째를 맞은 26일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공동취재) 2024.06.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6/NISI20240626_0020393932_web.jpg?rnd=20240626144752)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 사흘째를 맞은 26일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공동취재) 2024.06.26. [email protected]
이와 더불어 화재가 발생한 업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는 점도 안전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 역량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지금 정부엔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아리셀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한 업체인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의 보상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 근로자 산재 승인건수는 6178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8285건까지 증가했다. 또 고용부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812명) 10.5%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내국인들은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기피하는 건설업·제조업 등으로 투입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3월말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137명, 제조업에서 117명으로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아리셀과 같은 제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압도적이다. 통계청의 업종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19만9269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4만7191명 중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같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 국내 외국인 인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화성 공장 화재는 산업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사업주에 경종을 울린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와 근무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정부의 산재 예방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건 사실"이라며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고와 같은 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심지어 아리셀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한 업체인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의 보상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 근로자 산재 승인건수는 6178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8285건까지 증가했다. 또 고용부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812명) 10.5%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내국인들은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기피하는 건설업·제조업 등으로 투입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3월말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137명, 제조업에서 117명으로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아리셀과 같은 제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압도적이다. 통계청의 업종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19만9269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4만7191명 중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같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 국내 외국인 인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화성 공장 화재는 산업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사업주에 경종을 울린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와 근무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정부의 산재 예방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건 사실"이라며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고와 같은 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