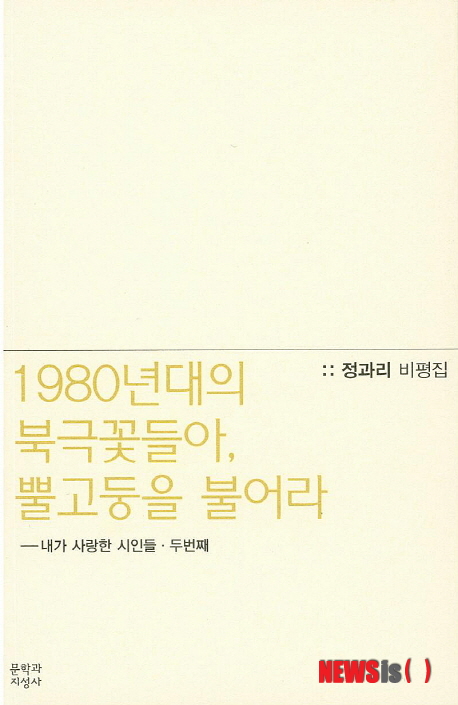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불문학을 토대로 한 해박한 지식, 정교한 논리, 강렬하고 유려한 문장이 어우러진 비평으로 한국 문학 비평의 미학적 수준을 끌어올린 평론가로 손꼽히는 문학평론가 정과리(56·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평론집을 냈다.
1979년 재학생 신분으로는 드물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조세희론'으로 입선하며 본격적인 비평활동을 시작한 정과리는 계간 '문학과지성'을 이은 계간 '문학과사회'의 편집동인으로 오랫동안(1988~2004) 한국문학 현장의 담론을 선도해온 장본인이다.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뿔고둥을 불어라'는 '공감의 비평'으로 유명한 그가 '글숨의 광합성' 이후 5년만에 묶어낸 책으로 2008년에 선보인 '네안데르탈인의 귀향'을 잇고 있다. 전작에서 김수영·고은·정현종·황동규·오규원 등 60~70년대를 풍미했던 시인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책에서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말 사이에 등단한 시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부에서 그는 최근 국내외 문학사회적 정황을 조망하면서 문학의 사회적 지형, 문학 창작과 문학 비평의 지위를 묻는 이론적 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함께 거론한다. 책의 존재 근거를 밝히는 글들이다.
반세기 전 문학은 사회의 거울이고 사회 변화의 시험장이었지만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세계 문학은 개인의 사적인 삶으로 선회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개인 체험의 묘사나 내면에 대한 탐구 혹은 영성의 발견에 현실(사회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존적 개인의 삶이 세계의 변화에 작용하지 않는 한 그 문학이 사회적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문학이 문화로, 문화가 한류로 이동하고 인문학이 부가가치를 낳는 창의적 산업이론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잘 팔리는 대중문학이 문학적 가치까지 독식하는 오늘의 현실을 짚고 그 가운데 가장 혹독한 운명을 겪은 것이 시라고 지적한다. 미디어에 포박된 주관성의 사회에 노예로 포박된 채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그는 1980년대 시들에 주목한다. 2부와 3부는 1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반문하며 동시에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는 데 할애됐다. 격동의 80년대를 살았던 이성복·황지우·김혜순·최승자·고정희·김정환·최두석·김영승·김승희·김정란·송재학·백무산·황인숙 등을 통해서다. 저자는 이들이 삶을 주어진 관념의 틀 안에 가두지 않고 생생하고 풍요롭게 되살아보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말한다.
시인 이성복과의 오랜 문우지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 '그리움의 자리-이성복 형에 대한 기억'은 4부에 자리했다. 이는 서문에서 1980년대 문학을 "내 문학의 뿌리"라고 정의한 저자가 동 세대의 문학과 시인들을 향해 쓴 연서로도 읽힌다.
"1980년대 문학은, '잠재'라는 어휘가 그대로 가리키듯, 그들의 글쓰기는 무의식적 실천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작동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1980년대 문학을 돌이켜본다면, 바로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이다."(책머리에) 482쪽, 2만1000원, 문학과지성사
[email protected]
1979년 재학생 신분으로는 드물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조세희론'으로 입선하며 본격적인 비평활동을 시작한 정과리는 계간 '문학과지성'을 이은 계간 '문학과사회'의 편집동인으로 오랫동안(1988~2004) 한국문학 현장의 담론을 선도해온 장본인이다.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뿔고둥을 불어라'는 '공감의 비평'으로 유명한 그가 '글숨의 광합성' 이후 5년만에 묶어낸 책으로 2008년에 선보인 '네안데르탈인의 귀향'을 잇고 있다. 전작에서 김수영·고은·정현종·황동규·오규원 등 60~70년대를 풍미했던 시인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책에서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말 사이에 등단한 시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부에서 그는 최근 국내외 문학사회적 정황을 조망하면서 문학의 사회적 지형, 문학 창작과 문학 비평의 지위를 묻는 이론적 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함께 거론한다. 책의 존재 근거를 밝히는 글들이다.
반세기 전 문학은 사회의 거울이고 사회 변화의 시험장이었지만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세계 문학은 개인의 사적인 삶으로 선회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개인 체험의 묘사나 내면에 대한 탐구 혹은 영성의 발견에 현실(사회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존적 개인의 삶이 세계의 변화에 작용하지 않는 한 그 문학이 사회적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문학이 문화로, 문화가 한류로 이동하고 인문학이 부가가치를 낳는 창의적 산업이론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잘 팔리는 대중문학이 문학적 가치까지 독식하는 오늘의 현실을 짚고 그 가운데 가장 혹독한 운명을 겪은 것이 시라고 지적한다. 미디어에 포박된 주관성의 사회에 노예로 포박된 채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그는 1980년대 시들에 주목한다. 2부와 3부는 1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반문하며 동시에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는 데 할애됐다. 격동의 80년대를 살았던 이성복·황지우·김혜순·최승자·고정희·김정환·최두석·김영승·김승희·김정란·송재학·백무산·황인숙 등을 통해서다. 저자는 이들이 삶을 주어진 관념의 틀 안에 가두지 않고 생생하고 풍요롭게 되살아보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말한다.
시인 이성복과의 오랜 문우지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 '그리움의 자리-이성복 형에 대한 기억'은 4부에 자리했다. 이는 서문에서 1980년대 문학을 "내 문학의 뿌리"라고 정의한 저자가 동 세대의 문학과 시인들을 향해 쓴 연서로도 읽힌다.
"1980년대 문학은, '잠재'라는 어휘가 그대로 가리키듯, 그들의 글쓰기는 무의식적 실천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작동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1980년대 문학을 돌이켜본다면, 바로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이다."(책머리에) 482쪽, 2만1000원, 문학과지성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