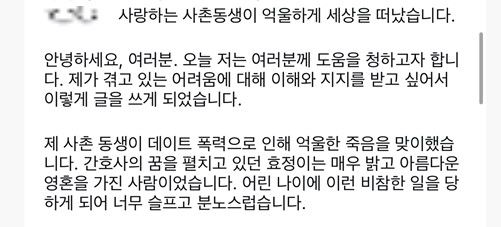사건 블랙박스 영상 공개 '국민적 공분' 일으켜
![[제주=뉴시스]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4)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http://image.newsis.com/2019/08/15/NISI20190815_0000379507_web.jpg?rnd=20190815201254)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보복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운전자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1개월만 이뤄진 1심 선고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만삭인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급히 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며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이 조수석에서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어제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장 부장판사는 A씨에게 인간적인 충고도 덧붙였다. 그는 "피고인은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며 "남한테 화를 내면 결국 그 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훈계했다.
피해자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녀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과 모욕감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헤아렸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는 법정 구속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재판부가 많이 배려해줘서 이제까지 합의에 노력해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피해자 측과 지속해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해당 혐의는 제외했다.
![[제주=뉴시스]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엄정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http://image.newsis.com/2019/09/07/NISI20190907_0000392153_web.jpg?rnd=20190907172523)
A씨의 폭력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커뮤티니 등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영상 속에는 B씨가 자녀 앞에서 한 남성에게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다.
급기야 A씨는 조수석에서 불안에 떨며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의 자녀들은 상당기간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총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8월 이 사안과 관련해 난폭·보복 운전자를 포함해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공개했던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지난해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주 특이하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 변호사는 “통상 운전 중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서로 과실이 있지만, 이 사건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잘못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