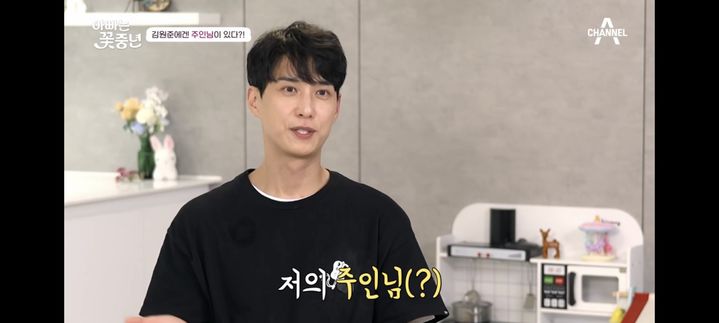박 전 의원은 1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을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표현한 것"이라며 자신의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관료집단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관료들이 제 핵심 문제의식"이라며 "정부 개혁이 성공하고 잘됐으면 좋겠지만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고, 이 배경에는 변하지 않는 관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를 겨냥 "대한민국 관료 중 기득권을 상징하는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지난 정권과 똑같은 방식의 경제 운용을 하는 데 대한 배후엔 관료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청와대와 정부내 갈등설이 있다"면서 한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소개해 당청 간 갈등을 재점화시켰다.
그는 당시의 발언을 언급, "한 당사자를 얼마 전 짧게 조우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사람으로부터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 '말을 할 수 없는 위치라 답답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더러 행간이 보였던 갈등설이 꽤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미 균형추가 기운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박 전 의원이 대면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장 실장이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아무래도 그동안 경제 수장 '투톱'인 김 부총리와 장 경제실장 사이에서의 갈등설은 꾸준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관료출신으로 혁신 성장을 내세운 김 부총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기조로 분배를 강조해 온 장 실장 간 견해 차이는 빈번히 있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 성장과 규제개혁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키를 바꾸면서 정가에서는 대통령이 장 실장에 대한 신뢰를 거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때문에 같은 참여연대 출신인 장 실장이 박 전 의원을 빈소에서 만나 하소연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점화된 당청 간 갈등설에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해당 논란에 대해 장 실장에 직접 확인해봤으며, 장 실장은 대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언론의 완전히 틀린 추측'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도 '박 전 의원이 만났던 청와대 관계자를 확인해봤는가'라는 질문에 "박 전 의원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이런 문제를 갖고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할만한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실장 갈등설에 대한 추가 질문에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에 박 전 의원과 대면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email protected]